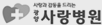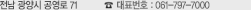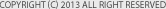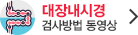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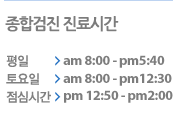

제목
일부일처제의 불편한 진실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크게 꼭 해야만 한다는 입장과 남들이 하니까 뒤쳐지지 않으려면 하는 게 좋다는 입장, 그리고 굳이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회적 약속인 결혼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현대사회가 정한 ‘일부일처제’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러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미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일부다처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본능적 ‘일부다처제’를 버리고 ‘일부일처제’를 선택한 것일까. 여기엔 여러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생물학적 요인이 존재한다.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해보자. 침팬지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체외 생식기가 커다랗게 부풀면서번식 할 준비가 됐음을 널리 알리지만 인간 여성은 언제 배란을 하는지 본인 자신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가 언제 배란을 하는지를 알려면 날짜를 세는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은폐된 배란 (concealed ovulation)’이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진화 현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부일처제를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침팬지 수컷들도 여러 암컷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암컷의 배란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도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간 남성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세운 것이 바로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 한 여성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되도록 자주 관계를 맺게 되면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자신의 2세를 낳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원리이다.

두번째 이유는 인간은 무력한 새끼를 낳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침팬지 아이가 나무를 탈 때 인간의 아이는 몸도 스스로 뒤척이지도 못하며 생후 1년이 돼서야 겨우 걸음마를 배울 정도로 약하게 태어난다. 따라서 이런 무기력한 아기를 키우는 데 가장 효율적인 체제가 바로 일부일처제이다. 부부가 힘을 합쳐 아기를 키워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동물인 ‘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인간을 제외하고 부부가 함께 자식을 기르며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대표적인 동물인 새는 약하게 태어난 자식을 암컷이나 수컷이 혼자 기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둥지에 알을 놔둔 채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일 또한 위험천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부부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결혼과 이혼의 반복, 결국은 일부다처제!
하지만 이런 갈매기들도 인간과 같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성격차이로 말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핸드(judith hand) 박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바닷가의 갈매기가 네 쌍 중 한 쌍이 일년을 넘기기 무섭게 갈라서며, 그 이유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갈매기 부부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12시간 마다 교대하는데 서로 위험한 바깥일은 덜 하려 하고 집에 더 있겠다며 버틸 경우 자주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이혼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혼 후 다른 이성과 재혼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헤어지는 여성과 남성이 많지만 둘 중 남성의 재혼율이 높다는 것은 ‘일부일처제’보단 사실상 ‘일부다처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연속일부일처제(serial monogamy)라고 불리며, 어느 특정한 순간에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더라도 평생 여러 번 결혼을 하면 결국 일부다처제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20대 후반부터, 남성은 30대 초반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진정한 ‘일부일처제’의 의미가 흐려진 요즘, 인간 스스로 만든 ‘결혼’이라는 틀 안에 갇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참고 = 도서 ‘다윈지능’, 최재천 지음>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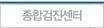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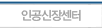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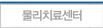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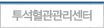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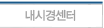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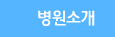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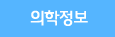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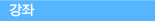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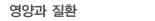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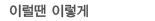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